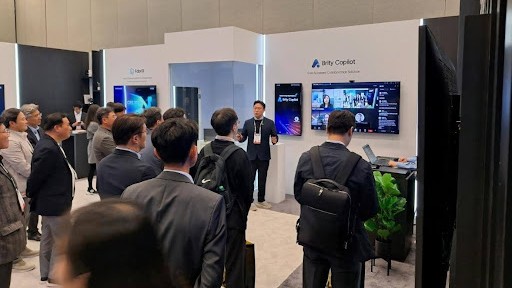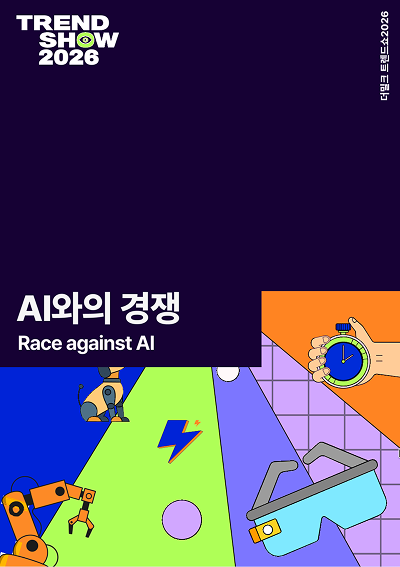에이전트 AI시대 1년, "왜 AI도입에 실패하는가?" 맥킨지가 배운 교훈 4가지

2030년 522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AI 에이전트 시장
대다수 기업이 에이전트를 '만능 도구'로 착각하고 워크플로우 고민 없이 도입중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도입은 기술 배포가 아닌 '신입사원 채용 및 온보딩' 관점에서 접근 필요
인간의 역활변화 : 검증감독관
2024년이 생성AI의 '신기함'에 열광하던 시기였다면, 2025년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실행'을 증명해야 하는 해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앞다퉈 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들 상당수가 투자 대비 저조한 성과에 직면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회사 업무 방식(워크플로우)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둔 채 에이전트만 얹는 방식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마치 말(馬) 시대의 도로에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격이다. 성공한 기업들은 '더 똑똑한 에이전트'가 아닌 '재설계된 업무 흐름'에 집중했다. 도로 자체를 다시 깔았다.
더 근본적인 전환은 에이전트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선도 기업들은 에이전트를 일회성 소프트웨어 배포가 아닌 '계속 성장하는 팀원'으로 다룬다. 신입 사원에게 업무를 맡긴 뒤 방치하지 않듯, 에이전트에도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AI 슬롭(AI Slop)'이라 불리는 그럴듯하지만 쓸모없는 결과물만 양산된다. 실리콘밸리에서 "측정하는 것이 결과를 만든다(You get what you measure)"라는 격언이 에이전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다.
재사용의 경제학은 더 흥미롭다. 대부분 기업이 작업마다 새로운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 패턴이 보인다. 데이터 검증, 문서 분석, 고객 응대 같은 반복 기능을 자산화해 플랫폼으로 구축하면 불필요한 업무의 30~50%가 사라진다. 바퀴를 매번 재발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에이전트 경제학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사라지는가? 오히려 격상된다. '실행자'에서 '설계자'로, 단순 작업의 수행자에서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물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최종 책임자'로 진화한다.
에이전틱 AI 시대, 진짜 경쟁력은 기술 도입 속도가 아니라 조직의 DNA를 재설계하는 '결심의 힘'에 달려 있다. 실리콘밸리가 증명했듯, 결국 이기는 건 더 나은 기술이 아니라 더 과감한 재설계를 감행한 조직이다.